Update
 ▲ (사진출처=공공운수노조)
▲ (사진출처=공공운수노조)
비극은 도처에 있다.
33살의 청년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은 것과 2018년 24살의 청년 김용균이 컨베이어에 끼어 죽은 것은 얼마나 다른 것일까? 2017년 제주의 생수업체에서 프레스에 눌려 죽은 18살 이민호 실습생과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죽은 19살 김모 청년은 또 어떠한가? 한 사람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 죽은 거룩한 죽음이고 다른 죽음은 단지 가슴 아프고 슬픈 일로 그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골목마다 있는 천주교 성당과 개신교 예배당에서는 12월 16일에 추모예식이 있었어야 한다.
과연 그러했는가? 한 주 후로 다가온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구유와 성탄트리는 있을망정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청년에 대한 추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울분이거나 한탄으로 그칠 태세다.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나 실제로는 아무 것도 못보는 이른바 ‘청맹과니’는 교회 안에도 넘친다. 대림3주일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말로 가득하다. 자선주일은 누구를 도와주라는 의미를 넘어 제 스스로를 바로보라는 날이다. 그러하다. 교회는 왜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왜 다니는 것인가?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루카11,16-19. 대림2주간 금요일 복음)
천주교회의 미사와 개신교회의 예배는 의식(儀式)으로서의 전례(典禮)이다. <가톨릭대사전>에서 ‘전례’는 개인의 신앙생활과는 구별되며 ‘이 말의 원어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10,11에 나오는 그리스어의 liturgia이며, 민중(laos)에 대한 봉사(ergon)를 의미하였다.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교회의 구빈사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였다(2고린 9,12). 그런데 민중에 대한 봉사나 구빈사업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뒷날에는 교회의 의식이 전례라는 말로 굳어지게 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를 통해서 우리 속죄의 구원사업이 수행된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된 교회의 본질을 다른 이에게 드러내 보이고 명시하는 데 가장 큰 도움”(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이 되는 것이 전례라고 말한다. 전례는 하느님과 구원되어야 할 인간들과의 결합이며, 끊임없는 만남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기에 더욱 그러하다. 교회는 전례행위로서 세상의 ‘기쁨과희망, 슬픔과 고뇌’를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사목헌장 1항에 새겨두지 않았는가?

미사를 사업으로 만드는 것은…
미사를 팔아먹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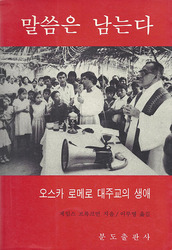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1917-1980)는 성인품에 오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로메로는 살해된지 14년 만인 지난 1996년 시복심사를 거쳐 2015년 교종 프란치스코에 의해 ‘순교자’로서 ‘복자’가 된 후 올해, 즉 2018년 10월 14일 성인으로 선포되었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시성식 미사에서 로메로 대주교의 혈흔이 남아 있는 띠를 매어서 로메로 피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이전의 사제 로메로가 생각한 미사란 무엇이었을까? 누구를 위하여 미사는 행해지고 사제는 어떤 마음으로 집전해야 하는지 되새겨 볼 일이다.
1979년 6월 엘살바도르의 수많은 무고한 자들이 살해되고 체포되고 행방불명된 가운데 40세의 젊은 사제 라파엘 팔라치오스도 희생자의 한명이었다. 교구장이었던 로메로는 6월 30일, 그 날 주교 관구의 모든 미사를 취소 시켰다. 그 날 로메로는 관구 전체 하나뿐인 미사 강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성당의 단일 미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밝히는 미사이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미사의 아름다움-거룩하고 나와 남의 구원에 대한 충동이 느껴지는 미사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는 봉화입니다.” 그는 미사의 남용을 비난했다. “사람들의 편의만을 따르며 … 마치 하느님을 한 가족이나 어느 사회계층의 종인 것처럼 생각하며 … 혹은 미사가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 숭배를 위하고, 죄로 넘치는 상황을 용서하는데 이용되며 … 오로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행사를 신문에 실리게 하고 … 더구나 미사를 욕심에서 집전하고 미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 때, 그것은 교회 내에서 미사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단지 돈을 만들 목적으로 미사 회수를 늘린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팔았던 유다의 행위와 똑같은 짓이며,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구나’ 하시며 주님이 성전에서 집어 들었던 채찍을 맞을 만한 것입니다.”(『말씀은 남는다』 제임스 브록크먼. 분도출판사. 1988. 281쪽)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가지지 못한 자들’과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죄인들’의 비극 앞에 우리는 하다못해 세례자 요한에게라도 물어보던 세리의 심정으로 물어야한다.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루카3,12) 라고 청하면 “일단 함께 슬퍼하고 울어라.”라고 답할지도 모를 일이다. 과연 교회는 ‘싸구려 노동판’이라 불리는 밥벌이의 슬픔을 ‘거룩한’ 전례로 품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미사에 적힌 전례력을 따라할 불과할 뿐인가? 유대인 랍비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의 시(<풍경소리> 2018년 12월호 발췌)가 가슴 저미는 바람소리 되길 바라며.
용서
물로 몸을 씻을 때 진저리치며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백만 노동자들의 땀이다.”
밤거리 여인들은 우리 아버지 의붓딸들,
그리고 끔찍한 범인들은
어쩌면 우리 집에서 이사 간 사람들.
살해당한 이들을 떠올리면,
살생을 내가 부추겼다는 생각이 들지요.
아마도 우리 마을 천더기들을
욕보인 건 나일 거예요.
내 안의 무엇이 고백합니다.
“당신의 그 고통, 천번 만번 내 탓이오.”
당신 문간에,
당신 감옥에,
당신 병원에,
용서를 빌며 이 머리 던지고 싶습니다.
 [가스펠:툰]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제1독서 (열왕기 하권 5,14-17)그 무렵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일러 준 대로,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나병 환자인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스펠:툰]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제1독서 (열왕기 하권 5,14-17)그 무렵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일러 준 대로,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나병 환자인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스펠:툰]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제1독서 (하바쿡 예언서 1,2-3; 2,2-4)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구해 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재난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제 앞에는 억압과 폭력뿐, 이느니 시비요 생기느니 싸움.
[가스펠:툰]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제1독서 (하바쿡 예언서 1,2-3; 2,2-4)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구해 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재난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제 앞에는 억압과 폭력뿐, 이느니 시비요 생기느니 싸움.
 [가스펠:툰]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제1독서 (아모스 예언서 6,1ㄱㄴ.4-7)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그들은 상아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 떼에서 고른 어린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수금 소리에 따라 되잖은 노래를 불러 대고 .
[가스펠:툰]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제1독서 (아모스 예언서 6,1ㄱㄴ.4-7)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그들은 상아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 떼에서 고른 어린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수금 소리에 따라 되잖은 노래를 불러 대고 .
 [가스펠:툰] '십자가'들고 '돈'벌면 안되나요?
제1독서 (아모스 예언서 8,4-7)빈곤한 이를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이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너희는 말한다. “언제면 초하룻날이 지나서 곡식을 내다 팔지? 언제면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내놓지? 에파는 작게, 세켈은 크게 하고 가짜 저울로 속이자. 힘없는 자를 돈으로 사들이고 빈곤한 자를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들이자. 지스.
[가스펠:툰] '십자가'들고 '돈'벌면 안되나요?
제1독서 (아모스 예언서 8,4-7)빈곤한 이를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이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너희는 말한다. “언제면 초하룻날이 지나서 곡식을 내다 팔지? 언제면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내놓지? 에파는 작게, 세켈은 크게 하고 가짜 저울로 속이자. 힘없는 자를 돈으로 사들이고 빈곤한 자를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들이자. 지스.
 [가스펠:툰]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제1독서 (민수기 21,4ㄴ-9)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 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
[가스펠:툰]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제1독서 (민수기 21,4ㄴ-9)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 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
 [가스펠:툰]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제1독서 (지혜서 9,13-18)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저희는 세상 것도 거의 짐작하지 못하고 손에 닿..
[가스펠:툰]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제1독서 (지혜서 9,13-18)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저희는 세상 것도 거의 짐작하지 못하고 손에 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