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근대에서의 종교적 경험의 탈락

벨테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신 또는 신적인 것에 대한 경험을 확신하지 못하게 된 것을 근대의 ‘세속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로 인해 오늘날 서양의 ‘우리들’은 신의 ‘있음’에 대해 명백하게 말하지 못한다. 즉 있다고도, 그렇다고 없다고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종교적 경험’은 우리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그런데 벨테는, ‘종교적 경험’의 멀어짐 내지 부재가 경험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어떻게든 ‘종교적 경험‘과 관련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 벨테는 ’종교적 경험‘이 우리들의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한 증인들로서 브레히트(Bertolt Brecht)와 리지외의 테레사 수녀를 든다. 이 두 사람에게서 특징적인 점은 “떨어져 나감 그 자체”가 경험되고 있다는 것, 그것도 그 “떨어져 나감”이 “아무것도 없음”으로서 경험되고 있다는 것이다. 벨테는 이러한 ’종교적 경험‘의 떨어져 나감을 본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종교적 경험‘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종교적 경험이 우리들의 삶으로부터 빠져나가는가? 벨테는 그 이유를 “근대의 자율적 이성의 지배”, 베버(Max Weber)의 말로 하자면, “목적 합리적 이성의 지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벨테에 따르자면, 근대의 이성은 ‘과학과 기술’의 형태로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있다. 벨테 자신은 ‘과학과 기술 자체’가 종교적 문제에서는 완전히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과학과 기술 속에서 작용하는 ‘근대적 이성’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는 하이데거가 기술의 본질로 밝혀낸 ‘몰아세움(닦달) 개념’ 또한 이러한 이성의 숨겨진 본질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벨테에 따르자면, 하버마스는 과학과 기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목적 합리성’이 산업화와 더불어 우리들 오늘날의 삶, 즉 ‘생활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계산적 또는 합리적 이성의 지배력이 확산됨으로써 모든 것, 즉 전체 세계는 ‘조절 가능하고 지배 가능한 것’으로서 고찰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은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⑵
벨테는 만일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과학과 기술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사용에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그 이데올로기는 신에 대한 인간의 콤플렉스로서 발생한 것, 즉 인간이 신처럼 전능해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빚어진 가상의 산물로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능 콤플렉스’가, 근본적으로 과학적, 기술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성취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주어질 수 없다고 믿게 만든다는 데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상이 과학적·기술적이지 않은 경험의 지평을 차단해 버림으로써 종교적 경험의 영역까지 닫아버린다는 데 있다.⑶
오늘날 ‘우리들’은 기술화에 대한 불안감과 기술화된 세계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아간다. 벨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의미 문제’로서 규정하고 있다. 의미 문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와 같은 형식으로 결국 ‘전체에 대한 문제’인 셈이다. ‘의미 문제’가 문제되고 있다는 것은 경험의 영역을 선택적으로만 인정하는 ‘근대적 이성’을 넘어선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넘어섬’은, 근대적 이성의 눈으로 보자면, ‘무(아무것도 없음의 영역)’ 속으로 뛰어내리는 것과도 같다.
‘목적 합리적, 과학적, 기술적 문명’의 한가운데서 실행되는 이러한 ‘뛰어내림’은 어떤 것에도 매달릴 수 없게 되는 것과 같다. 현대 문명 자체가 사실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포퍼(Karl R. Popper)는 현대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과학이 늪 위에 세워진 기둥 위에 건설되어 있다고 본다. 벨테는 이러한 문명 비판 내지 현대 비판에 바탕해 오늘날의 근본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오직 밤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다.”⑷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 자신의 ‘있음’의 첫 번째 토대 내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종교적 경험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의 경험과 근대적 허무주의
 ▲ 김아타의 `ON-AIR Project153-1: Ice Parthenon, The monologue of Ice`. 얼음으로 만든 파르테논 신전이 녹아내리는 과정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았다.
▲ 김아타의 `ON-AIR Project153-1: Ice Parthenon, The monologue of Ice`. 얼음으로 만든 파르테논 신전이 녹아내리는 과정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았다. 신이 떠나 버린 시대에 신을 만날 수 있는 방식은 신의 빈자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사람들이 대개 ‘무의 경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때문에, 위대한 사상가들이나 시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벨테가 말하는 무의 경험은, 그 경험이 너무나 섬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전율케 하는 것’이다.
파스칼(B. Pascal)을 전율케 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무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이다. ‘끝이 없는 것’은 ‘끝이 있는 것’, 그래서 그 ‘끝’을 ‘끝매김 할 수 있는 것’, 달리 말해, ‘유한한 것’에 대한 부정, 즉 ‘아니게 함’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 우리가 붙잡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끝이 있는 것들’뿐이다. 파악 불가능한 것은 ‘무’이다. 이때 ‘무’는 ‘아무것도 아닌 것’ 또는 ‘없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무’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한한 것이 아니기에 파악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기에 없는 것이라고 파악된 무한한 것은 그것의 ‘파악 불가능성’ 속에서 즉 그것의 ‘없음’ 속에서 경험된다. 그리고 이러한 ‘없음’은 ‘끝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부정’, 즉 ‘끝이 있는 것의 아님’ 속에서 언제나 경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끝없는 것’과 그것의 ‘없음’은 이 세계와 인간 모두를 삼킬 수 있는, 즉 우리를 전율케 하는 것으로서 경험된다.⑸
니체는 모든 것들의 창조자로서의 ‘신의 죽음’을 선포했다. 신의 죽음은 모든 것이 그 의미를 잃어 버렸음을 뜻한다. 신이 죽음으로써 신에 의해 세워진 모든 것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허무주의다. 니체는 이러한 ‘없음의 경험’을 견뎌내라고, 아니 극복하라고 촉구한다. 니체는 자신의 초인이 이러한 ‘없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힘에의 의지’를 통해 허무주의를 극복하기커녕 오히려 인간들을 근대적 전체주의로 몰아넣고 말았고, 이 전체주의는 인간적인 것의 대 파국이 되고 말았다. 결국 허무주의는 극복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⑹
벨테는 ‘없음’에 대한 경험을 우리들 시대의 ‘근본 경험’으로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의 증인들로서 그는 하이데거와 브레히트도 꼽고 있지만, 엘리오트(T.S. Eliot)와 파울 켈란(Paul Celan)을 중요한 증인으로서 다루고 있다.⑺
엘리오트의 시는 ‘없음’, ‘어둠’, ‘빔’, ‘침묵함’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기서의 ‘없음’은 결코 무차별적인 것 아니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관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전율케 하는 것으로서 경험된다.⑻
파울 켈란은 ‘없음의 자리’에 대한 종교적 경험을 시로 노래하고 있다. 신이 나타나야 할 자리로서의 ‘편도’에는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는 ‘아무것도 없음’만을 볼 뿐이다. 언제나 ‘아무것도 없음’만이 지속될 뿐 거기에는 아무 흔적이 없다.⑼
벨테는 우리 시대의 다양한 ‘없음 경험들’에 대해 다양한 증인들을 언급함으로써 “신의 떠나버림” ― 벨테의 말로는 신의 경험의 “떨어져 나감” ― 과, 그로 인한 “아무것도 없음” 그리고 허무주의 등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근본 경험’임을 말하고자 한다. 벨테는 이러한 ‘없음 경험’은 결코 ‘경험 없음’이 아님을 강조한다. 만일 ‘없음 경험’이 경험이라면, 그것은 그러한 경험을 한 자를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보통의 변화는 그러한 경험 자체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그 경험을 지키며 물러서지 않은 채 그 속에 머무르는 것도 가능하다.
▶ 다음 편에서는 ‘없음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⑴ 참조 Bernhard Welte, Das Licht des Nichts (아무것도 없음의 빛), Düsseldorf 1980, 22 이하.
⑵ 참조 같은 책 26 이하.
⑶ 참조 같은 책 28.
⑷ 같은 책 36.
⑸ 참조 같은 책 37 이하.
⑹ 참조 같은 책 38 이하.
⑺ 참조 같은 책 40 이하.
⑻ 참조 같은 책 41.
⑼ 참조 같은 책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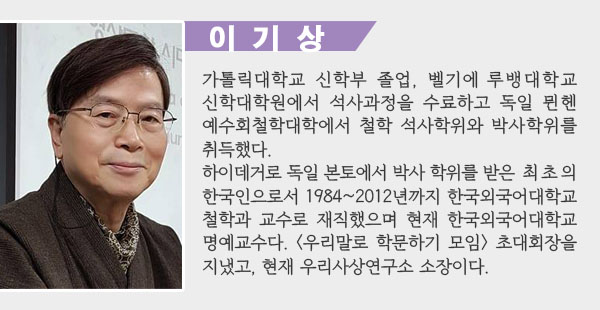
이기상 교수님의 ‘허무주의 시대와 영성 - 존재의 불안 속에 만나는 신(神)의 숨결’은 < 에큐메니안 >에도 연재됩니다.
 [가스펠:툰]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2026년 3월 08일 사순 제3주일제1독서 (탈출기 17,3-7)그 무렵 백성은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가스펠:툰]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2026년 3월 08일 사순 제3주일제1독서 (탈출기 17,3-7)그 무렵 백성은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가스펠:툰]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2026년 3월 01일 사순 제2주일제1독서 (창세기 12,1-4ㄱ)그 무렵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가스펠:툰]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2026년 3월 01일 사순 제2주일제1독서 (창세기 12,1-4ㄱ)그 무렵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가스펠:툰]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2026년 2월 22일 사순 제1주일제1독서 (창세기 2,7-9; 3,1-7)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
[가스펠:툰]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2026년 2월 22일 사순 제1주일제1독서 (창세기 2,7-9; 3,1-7)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
 [가스펠: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2026년 2월 15일 연중 제6주일제1독서 (집회서 15,15-20)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 있다. 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
[가스펠: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2026년 2월 15일 연중 제6주일제1독서 (집회서 15,15-20)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 있다. 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
 [가스펠:툰]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리라
2026년 2월 8일 연중 제5주일제1독서 (이사야서 58,7-10)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가스펠:툰]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리라
2026년 2월 8일 연중 제5주일제1독서 (이사야서 58,7-10)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가스펠:툰]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2026년 2월 1일 연중 제4주일제1독서 (스바니야 예언서 2,3; 3,12-13)주님을 찾아라,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아! 의로움을 찾아라. 겸손함을 찾아라. 그러면 주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화를 피할 수 있으리라.나는 네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가스펠:툰]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2026년 2월 1일 연중 제4주일제1독서 (스바니야 예언서 2,3; 3,12-13)주님을 찾아라,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아! 의로움을 찾아라. 겸손함을 찾아라. 그러면 주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화를 피할 수 있으리라.나는 네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