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없음의 이중성과 그 전환 가능성
벨테는 ‘경험 가능한 없음’으로부터 등을 돌리기커녕 그 속으로 보다 가까이 들어가려 한다. 어떤 것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의 구조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없음의 구조’는 어떠한가?
여기서 말해지는 ‘없음’은 ― 사물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 ‘있는 모든 것’과 관계한다. 이 말의 의미는 ‘없음’에는 그 테두리, 즉 한계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없음’이 ‘끝날 수 없는 됨됨이(무한성)’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없음’은 만족을 모른다. ‘없음’은 모든 것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된다. ‘없음’은 ‘끝날 수 없는 심연’이다. 없음에는 바닥도 끝도 없다. 따라서 ‘없음‘은 어떠한 규정성도 거부한다. ’없음‘을 규정할 수 있으려면, 모든 것을 끝없이 부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없음‘ 속에서의 ’부정성‘, 즉 ’아니게 하는 됨됨이‘는 ’끝날 수 없는 것‘인 셈이다.
있는 것이 있는 한, 그것 또한 끝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의 ‘없음’은 ― 여기서 벨테가 말하고자 하는 ‘없음’은 보다 정확히는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할 수 있기에 ― 결코 ‘있는 것’을 통해서는 규정될 수 없다. ‘없음’은 결코 규정될 수도, 또 파악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음’으로서의 ‘없음’은 어디에나 피어날 수 있다. 벨테는 “‘없음’은, 그것이 물어졌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로 다가온다. 그것은 결코 흥정하는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없음’은 어디에나,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또는 어떤 것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⑴
‘아무것도 없음’은 끝날 수 없고, 그것은 그것이 경험될 수 있기 위해, 어떠한 조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벨테는 앞서의 증인들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이러한 ‘없음’이 ‘신이 사라져 버린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그에게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이 신을 ‘무한자’ 내지 ‘무조건자’로서 규정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음’은, 하이데거의 말로써 말해 보자면, ‘신의 너울’이다.
‘아무것도 없음’은, 그것이 모든 것과 맺어져 관계하는 한, 다시 말해, 그 자신과도 관계해야 하는 한, 그 자신조차도 거절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는 그러한 ‘없음’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벨테는 이러한 사태를 “아무것도 없음은 침묵하는 것이다”고, “그것은 침묵함 그 자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은 경험된다. 즉 그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를 움직이며,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침묵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없음의 등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니면 그것의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는지에 대해 결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 만일 그 등 뒤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지 또한 우리로서는 결코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벨테는 이 모든 가능성들을 그저 열어 놓은 채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종교에 의지하여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내린 셈이다. 즉 ‘아무것도 없음’은 그에게는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무것도 없음’인 것이 아니라 ‘신이 떠난 빈자리’, 다시 말해, ‘신이 언제든지 다시 깃들일 수 있는 빈자리’, 따라서 ‘신의 자리’, 그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의 ‘자리’이다.⑵
‘아무것도 없음’의 긍정, ‘없음’을 거스르는 결단
벨테는 ‘아무것도 없음’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의 근거는, 벨테에 따르자면, 우리들이 이러한 ‘없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신뢰 또는 정의 등과 같은 ‘본래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결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결단은, 그것이 ‘없음’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없음의 경험’을 증명하는 것임과 동시에 ‘없음’에 의해 ‘두드러지게 규정되는 것’이다. 이제 저 ‘아무것도 없음’은 모든 것에게, 이 모든 것이 저 ‘없음’의 심연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 저마다의 의미를 각기 허용해 주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벨테는 이러한 ‘허용의 경험’을 ‘종교적 경험’으로서 이해한다.
벨테는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경험이 ‘신적인 것’ 내지 ‘신’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몇몇 증인들의 말을 끌어들임으로써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엘리오트의 시에서 말하는 ‘신의 어둠’은, ‘아무것도 없음’과 ‘어둠’의 경험이 ‘어둔 신’에 대한 신뢰로 바뀌는 것을 보여 주며, 파울 켈란의 시는 ‘왕처럼 짙은 파랑으로 빛나는 편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즉 시인은 텅 빈 곳에서 ‘아무것도 없음’만을 발견하다가 결국 파랑으로 빛나는 왕, 즉 신을 만남으로써 그와 같은 빛을 띠게 되고, 그로써 ‘아무것도 없음’ 또한 파랗게 된다. 야스퍼스(Karl Jaspers) 또한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경험을 ‘초월의 경험’ 즉 ‘신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다.⑶
벨테는 바이셰델(Wilhelm Weischedel)의 시를 통해 이러한 전환을 보다 비유적으로 그려내려 한다.
“어둔 술잔의 바닥 깊숙이에서
빛의 없음이 내비친다.
신성의 어둔 비침은
아무것도 없음의 빛이다.”⑷
이 시에서 ‘삶’은 ‘술잔’으로, ‘어둔 바닥’은 ‘아무것도 없음’의 그림자로서 묘사되고 있다. 술잔의 바닥은 어둡다. 즉 빛이 더 이상 비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빛의 없음이 내비쳐지고 있다. 시인에게 이러한 비침은 ‘신성’, 즉 ‘신의 눈짓’인 셈이다.
벨테는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경험’이 ‘없음의 빛남’ 또는 ‘신성의 빛남’에 대한 경험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언을 통해 허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방향에서 ‘종교적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암시하려 한다. 그는 이러한 암시가 결코 강제적일 수는 없고, 또 아무런 준비 없이 주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강조한다. 즉 이러한 전환의 지시를 ‘지시’로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그에 대한 일종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벨테가 세속화된 세계에서 신에게 이르는 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다음 편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신 존재 증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⑴ 참조 Bernhard Welte, Das Licht des Nichts (아무것도 없음의 빛), Düsseldorf 1980, 44 이하.
⑵ 참조 같은 책 45 이하.
⑶ 참조 같은 책 53 이하.
⑷ 같은 책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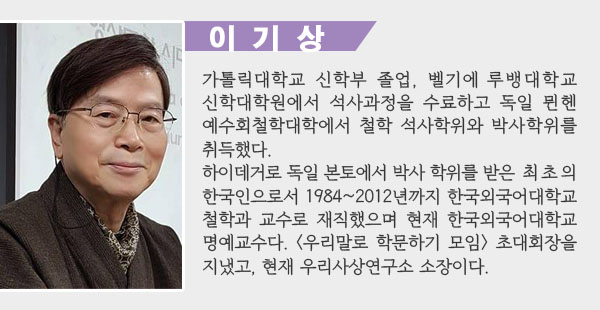
 [가스펠:툰]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제1독서 (지혜서 18,6-9)해방의 날 밤이 저희 조상들에게는 벌써 예고되었으니 그들이 어떠한 맹세들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은 의인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파멸을 기대하였습니다.과연 당신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
[가스펠:툰]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제1독서 (지혜서 18,6-9)해방의 날 밤이 저희 조상들에게는 벌써 예고되었으니 그들이 어떠한 맹세들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은 의인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파멸을 기대하였습니다.과연 당신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
 [가스펠:툰]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
제1독서 (코헬렛 1,2; 2,21-23)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애쓰고서는 애쓰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제 몫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또한 허무요 커다란 불행이다.그렇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그 모든 노고와 노심으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나날은 근..
[가스펠:툰]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
제1독서 (코헬렛 1,2; 2,21-23)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애쓰고서는 애쓰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제 몫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또한 허무요 커다란 불행이다.그렇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그 모든 노고와 노심으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나날은 근..
 [가스펠:툰]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제1독서 (창세기 18,20-32)그 무렵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
[가스펠:툰]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제1독서 (창세기 18,20-32)그 무렵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
 [가스펠:툰]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제1독서 (창세기 18,1-10ㄴ)그 무렵 주님께서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 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나리, 제가 나리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
[가스펠:툰]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제1독서 (창세기 18,1-10ㄴ)그 무렵 주님께서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 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나리, 제가 나리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
 [가스펠:툰]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제1독서 (신명기 30,10-14)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
[가스펠:툰]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제1독서 (신명기 30,10-14)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
 [가스펠:툰]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를 것이다
제1독서 (이사야서 66,10-14ㄷ)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던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너희가 그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
[가스펠:툰]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를 것이다
제1독서 (이사야서 66,10-14ㄷ)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던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너희가 그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