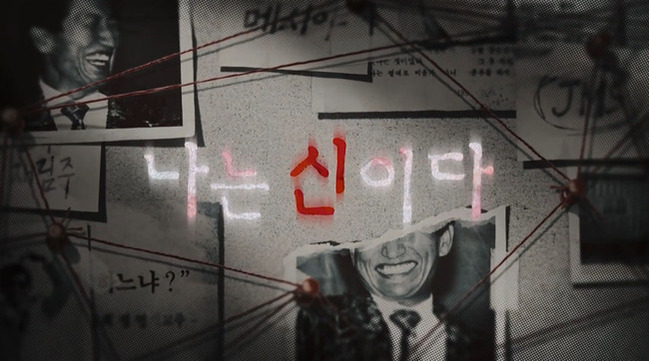-
 경제와 생태의 충돌, 한국인 ‘살림살이’ 지혜에서 해법을 얻자
“배고픈 건 참지만 배 아픈 건 못 참는다.”1972/73년 벨지움 루벵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일요일 성당에 미사를 갔는데 아마도 자선 주일이었던 것 같다. 한국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성금을 부탁한다며 돌린 사진들이 나의 국민적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 속에는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 다 찢어지고 더러워진 저고리와 ...
2020-08-10 이기상
경제와 생태의 충돌, 한국인 ‘살림살이’ 지혜에서 해법을 얻자
“배고픈 건 참지만 배 아픈 건 못 참는다.”1972/73년 벨지움 루벵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일요일 성당에 미사를 갔는데 아마도 자선 주일이었던 것 같다. 한국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성금을 부탁한다며 돌린 사진들이 나의 국민적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 속에는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 다 찢어지고 더러워진 저고리와 ...
2020-08-10 이기상
-
 인간 중심 ‘환경문제’에서 생명 중심의 ‘생태보존’으로
흔히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말 속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가 담겨 있다. “밤새 안녕하셨어요?”라는 인사가 가장 절실했던 때는 아마도 한국 전쟁 당시였을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친지들이 사라지거나 변을 당하던 그 시절, 밤새 무사했는지를 묻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물음이었다. 또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삶터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살아야 했던 시절에는 “식사하셨어요?”라는 인사가 서로의 정을 확인하는 관심의 표현이었다. 산업화 이후 정치와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인사말도 바뀌기 시작했다. “좋은 아침!” 미국과 유럽의 인사를 흉내 낸 이 세련되고 멋스러운 말 속에는 한창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선진국의 꿈이 담겨 있었다. 그러다 IMF가 터져 온 국민이 어려운 시절을 겪은 후에는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와 덕담이 최고의 인기를 끌기도 했다.
2020-08-03 이기상
인간 중심 ‘환경문제’에서 생명 중심의 ‘생태보존’으로
흔히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말 속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가 담겨 있다. “밤새 안녕하셨어요?”라는 인사가 가장 절실했던 때는 아마도 한국 전쟁 당시였을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친지들이 사라지거나 변을 당하던 그 시절, 밤새 무사했는지를 묻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물음이었다. 또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삶터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살아야 했던 시절에는 “식사하셨어요?”라는 인사가 서로의 정을 확인하는 관심의 표현이었다. 산업화 이후 정치와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인사말도 바뀌기 시작했다. “좋은 아침!” 미국과 유럽의 인사를 흉내 낸 이 세련되고 멋스러운 말 속에는 한창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선진국의 꿈이 담겨 있었다. 그러다 IMF가 터져 온 국민이 어려운 시절을 겪은 후에는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와 덕담이 최고의 인기를 끌기도 했다.
2020-08-03 이기상
-
76억 인류의 더불어 삶, 새로운 생명 담론이 필요하다 2011년 11월 1일 마닐라의 호세 바벨라 메모리얼 병원에서 지구촌 70억 번째의 아기가 태어났다. 지구촌 곳곳에서 축복과 부러움 속에 태어난 이 아기는 여자 아이로 이름은 ‘다니카 메이 캄마초’다. 아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게 되었고, 아기의 부모에게는 작은 상점을 열 수 있을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2020-07-27 이기상
-
 신을 찾아 나선 인간이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이문열이 『사람의 아들』에서 다루고 있는 변신론의 문제, 즉 죄 없이 고통받는 인간들이 허다한 모순적인 현실 앞에서 사랑과 정의의 하느님을 변론해야 하는 변신론의 문제는 그의 말마따나 인간의 영원한 주제 중의 하나다. 누구보다도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문제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대심판관의 전설」에서 인상 깊게 다루고 있다.
2020-07-20 이기상
신을 찾아 나선 인간이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이문열이 『사람의 아들』에서 다루고 있는 변신론의 문제, 즉 죄 없이 고통받는 인간들이 허다한 모순적인 현실 앞에서 사랑과 정의의 하느님을 변론해야 하는 변신론의 문제는 그의 말마따나 인간의 영원한 주제 중의 하나다. 누구보다도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문제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대심판관의 전설」에서 인상 깊게 다루고 있다.
2020-07-20 이기상
-
 이제 신을 뒤쫓을 때가 아니라 마중할 때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하스 페르츠 내지는 그를 등장시킨 민요섭의 신관(神觀)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말씀의 대변인이며 전파자 교육을 받으며 자라던 아하스 페르츠는 어느 날 빵이 없는 비참한 현실세계에서 고통 중에 버림받은 채 사는 사람들의 실상을 보고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데 대해 회의하게 된다. 결국은 자...
2020-07-13 이기상
이제 신을 뒤쫓을 때가 아니라 마중할 때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하스 페르츠 내지는 그를 등장시킨 민요섭의 신관(神觀)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말씀의 대변인이며 전파자 교육을 받으며 자라던 아하스 페르츠는 어느 날 빵이 없는 비참한 현실세계에서 고통 중에 버림받은 채 사는 사람들의 실상을 보고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데 대해 회의하게 된다. 결국은 자...
2020-07-13 이기상
-
 ‘빵’과 ‘말씀’, ‘이승’과 ‘저승’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빵이냐 말씀이냐」하는 양자택일로서 부각되고 있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둘러싼, 육체의 대변인 아하스 페르츠와 영혼의 대변인 예수 사이의 숙명적인 만남을 이문열은 광야에서의 예수의 유혹을 약간 수정해서 묘사하고 있다.
2020-07-06 이기상
‘빵’과 ‘말씀’, ‘이승’과 ‘저승’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빵이냐 말씀이냐」하는 양자택일로서 부각되고 있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둘러싼, 육체의 대변인 아하스 페르츠와 영혼의 대변인 예수 사이의 숙명적인 만남을 이문열은 광야에서의 예수의 유혹을 약간 수정해서 묘사하고 있다.
2020-07-06 이기상
-
 초월신을 거부하고 새로운 인간성을 발견하다
아하스 페르츠는 예수를 찾아가 이렇게 경고한다.“나자렛 사람 예수여, 왜 또 우리를 간섭하려 드는가요? 우리들 애통의 눈물과 노고의 땀으로 일구어 논 대지에서 다시 우리를 내쫓으려 하는가요? 나는 당신을 아오. 당신은 거짓 인자(人子)며, 거대한 독선의 아들, 그러잖아도 그을리고 있는 이 대지에 더 큰 불을 지르러 왔오. (…) 그러나...
2020-06-29 이기상
초월신을 거부하고 새로운 인간성을 발견하다
아하스 페르츠는 예수를 찾아가 이렇게 경고한다.“나자렛 사람 예수여, 왜 또 우리를 간섭하려 드는가요? 우리들 애통의 눈물과 노고의 땀으로 일구어 논 대지에서 다시 우리를 내쫓으려 하는가요? 나는 당신을 아오. 당신은 거짓 인자(人子)며, 거대한 독선의 아들, 그러잖아도 그을리고 있는 이 대지에 더 큰 불을 지르러 왔오. (…) 그러나...
2020-06-29 이기상
-
신에 대한 논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사람의 아들』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이문열은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신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혹 하더라도 그들은 쑥스러운 듯 수근거려 말했고, 더러는 자기들의 은어로만 말했다. 그래서 감히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달아오른다. 그러나 신은 우리의 영원한 주제 중의 하나다.” 2020-06-22 이기상
-
 ‘성스러움’으로부터 ‘신성’을, 그로부터 비로소 ‘신’을 사유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여 성스러움의 차원을 특징지어 보자.
자연이 깨어날 때, 다시 말해 자연의 말건넴에 응답할 수 있는 시인이 있을 때, 자연은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성스러움으로서 눈짓해 가리킨다. 시인 중의 시인인 횔덜린이 깨달은 성스러움으로서의 자연의 본질은 우선 시간들보다 오래고 신들보다 위에 있는 온전함 그 자체, 상처 날 수 없고 손상될 수 없고 깨질 수 없고 나뉠 수 없는 온통 그 자체이다. 모든 시원의 (원초)시원이며 모든 유래의 (원)유래로서 모든 갈래와 지류를 자기에서부터 유출시키면서도 그 자신은 조금도 손상되거나 줄어들지 않고 충일 그 자체로서 머물러 있는 마르지 않는 근원으로서의 원천 그 자체이다.
2020-06-15 이기상
‘성스러움’으로부터 ‘신성’을, 그로부터 비로소 ‘신’을 사유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여 성스러움의 차원을 특징지어 보자.
자연이 깨어날 때, 다시 말해 자연의 말건넴에 응답할 수 있는 시인이 있을 때, 자연은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성스러움으로서 눈짓해 가리킨다. 시인 중의 시인인 횔덜린이 깨달은 성스러움으로서의 자연의 본질은 우선 시간들보다 오래고 신들보다 위에 있는 온전함 그 자체, 상처 날 수 없고 손상될 수 없고 깨질 수 없고 나뉠 수 없는 온통 그 자체이다. 모든 시원의 (원초)시원이며 모든 유래의 (원)유래로서 모든 갈래와 지류를 자기에서부터 유출시키면서도 그 자신은 조금도 손상되거나 줄어들지 않고 충일 그 자체로서 머물러 있는 마르지 않는 근원으로서의 원천 그 자체이다.
2020-06-15 이기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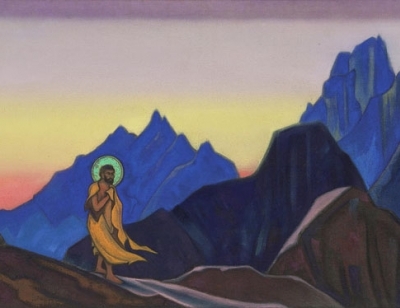 떠나버린 신들의 흔적을 알아챔
존재는 언제나 항상 스스로를 비추면서 언어에로의 도상에 있으며 사유는 존재의 진리를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비추며 언어에로 오고 있는 존재에 의해 요청 받도록 내맡겨야 하며, 그렇게 하여 “사유에서 존재가 언어에로 오게”끔 해야 한다(Hum 145).
2020-06-08 이기상
떠나버린 신들의 흔적을 알아챔
존재는 언제나 항상 스스로를 비추면서 언어에로의 도상에 있으며 사유는 존재의 진리를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비추며 언어에로 오고 있는 존재에 의해 요청 받도록 내맡겨야 하며, 그렇게 하여 “사유에서 존재가 언어에로 오게”끔 해야 한다(Hum 145).
2020-06-08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