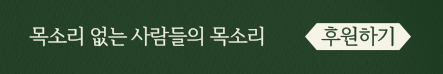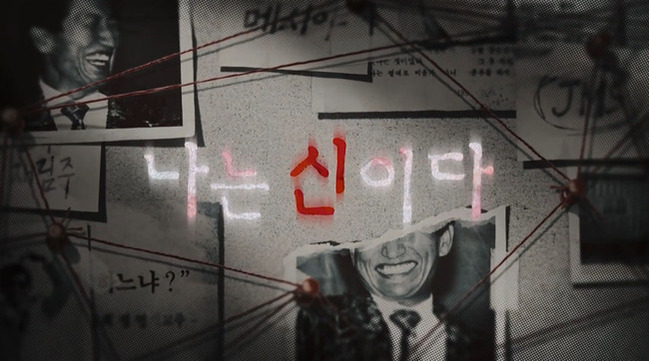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정부로부터 ‘특별창작지원금’ 1천만 원을 받았다. 그 덕에 다음해 장편소설 「검은 미로의 하얀 날개」(전3권)를 출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책 출간 경비로는 100만 원을 썼고, 900만 원은 원활한 창작 활동을 위한 생활 자금으로 사용했다.
또 그해 제43회 ‘충청남도문화상’을 받았다. 그해 충청남도문화상의 상금은 500만 원이었다. 그 후 선거법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문화상은 상금이 없어져서 권위를 잃고 말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튼 두 가지 경사가 겹쳤던 그해에는 또 공주영상정보대학 문예창작과에 출강을 하게 돼서 대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길지는 않았지만 대학 강단에서 젊은이들에게 소설문학과 인간학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을 내 인생의 보람으로 여긴다.
 ▲ 블랙리스트 수사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블랙리스트 수사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이처럼 1999년은 내 일생에서 가장 좋은 해였다. 1998년에 출범한 「태안문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생각하면 내 어깨에 가장 힘이 들어갔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왜 어깨에 힘을 주었을까?
바로 1997년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1998년 2월 새롭게 출범한 민주 정부가 기틀을 잡아나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나는 수평적 정권교체와 민주정권의 수립을 위해 지역에서 미력하나마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던 날은 개표 종료 시간을 전후하여 친구들과 태안읍내 모든 술집을 순회하기로 작정하고 내 일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주량을 과시하며 축배를 들기도 했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학습해가며, 개인적으로는 1천만원의 특별창작지원금도 받고, 충청남도문화상도 받고, 대학 강단도 밟아보았으니, 생각하면 1999년이 그립다.
박근혜 정부가 주는 지원금? 안 받고 만다
그 후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정부(문화예술위원회)에 창작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미 1999년에 1천만 원을 받았기에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신청을 할 수도 없으려니와 다른 작가들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또 한 번 창작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퇴짜를 맞고 말았다. 두 번 연거푸 퇴짜를 맞고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가 이명박 정부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글을 자주 쓰는데다가, ‘4대강 파괴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생명·평화미사’에 매주 참례하면서 열심히 ‘표’를 내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왕왕거렸다.
그런 의심을 하게 된 후로는 또다시 창작지원금을 신청하는 짓을 일체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의기소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박근혜 정부로 와서는 창작지원금 신청 따위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박근혜 정권의 속성을 일찍부터 잘 헤아리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치졸하고 난폭한 짓들을 자행하리라는 것을 예견했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창작지원금을 받는다면 그것 자체로 내 일생의 불명예가 되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세월호 유족들과 아픔을 나누는 쪽으로만 매진하면서 소설은 열심히 쓰지 않았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4년차인 2016년을 맞았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내가 8월말 정년퇴직했다. 40년 근속을 한 교직원이 정년퇴직을 하면 정부에서 훈장을 주는 관례가 아내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교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탓일 수도 있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에 저항하는 남편의 행동 때문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9월에는 KBS TV에서 일하는 여성 작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대본을 쓰는 프로에 출연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 작가와 세 차례 긴 통화가 있었다. 골격을 미리 다 짜놓고, 촬영 팀이 내려와 촬영만 하면 되었다.
함께 출연하기로 한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 작가가 담당 PD와 열심히 기획안을 만들겠지만, 결제를 하는 윗선에서 틀림없이 퇴짜를 놓으리라는 예견이었다.
아내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 작가는 그 후 감감무소식이었다. 그 작가에게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아내의 예상대로 윗선에서 퇴짜를 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때까지는 그런가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다. 어처구니없고 불쾌했지만, 이런저런 일이 다 있기 마련인 세상만사 중의 한 가지 일로 치부하기로 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내 이름
 ▲ 작년 10월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책임자 처벌과 예술검열 반대 예술행동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 = 블랙리스트예술행동_˝우리모두가블랙리스트예술가다˝)
▲ 작년 10월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책임자 처벌과 예술검열 반대 예술행동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 = 블랙리스트예술행동_˝우리모두가블랙리스트예술가다˝)그런데 그때 대전에서 사는 한 친구로부터 특이한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청와대에서 만들어 문체부로 내려 보낸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도가 나왔는데, 그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도 있다는 거였다. 그 사실을 알려주며 그 친구는 연거푸 ‘추카(축하)’라는 말을 했다.
세상에, 청와대에서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니! 놀랍고도 기가 막힌 일이었다. 그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이 있다고 친구에게서 축하 메시지를 받으니 더욱 묘한 느낌이었다.
보도를 확인한 아내도 내게 축하를 했다.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이 빠졌다면 얼마나 아쉽고 허전하겠느냐며 오히려 의기양양해 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이 오른 건 오히려 천만 다행이고, 평생의 영광이 될 거라며 기염을 토했다.
나로서는 일단은 불쾌했다. 어처구니없고 곤혹스러운 가운데서도 아내 말대로 다행스럽다는 기분이 들었다. 박근혜 정권의 치졸함과 반민주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작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건 그야말로 ‘영광’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약속을 어긴 KBS TV의 방송 작가가 확연히 떠올랐다. 어쩌면 그 블랙리스트가 위력을 발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뇌리에 꽂혔다. 그 역시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십중팔구 그 블랙리스트가 적용되었으리라는 생각이었다. 더욱이 ‘관영방송’인 KBS가 아닌가.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모양이다. 본격적인 수사 개시와 함께 관련 기사들이 봇물을 이룬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역시 최순실의 작품이라는 말이 들리는데, 수사를 해보면 언제 누구의 발상에 의해 누가 만들었는지, 대통령 박근혜도 알고 있거나 묵인 또는 지시를 했는지, 그게 언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었는지도 규명이 되리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내가 의문을 갖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왜 필요했느냐는 점이다. 그게 일시적으로 소용가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5년짜리 정권에게 그런 것이 왜 필요했느냐는 점이다. 그것의 소용가치를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신뢰할 것인지 정말로 궁금하다. 입만 열면 원칙과 신뢰를 되뇌던 박근혜의 메마른 언성을 떠올리면 더더욱 의아하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