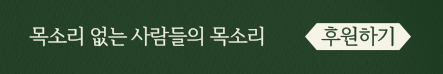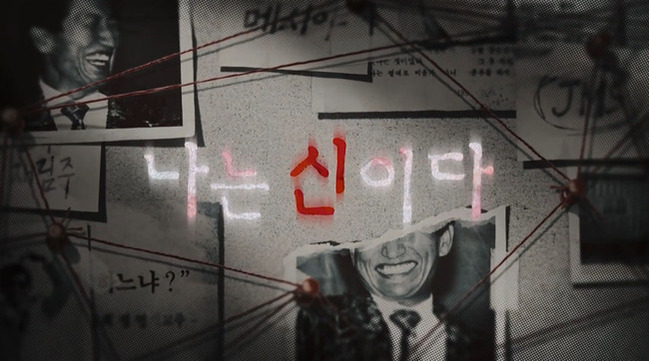2019년 8월 18일 일요일, 맑음

시우가 껍질을 벗고 사라진 매미를 찾는다. “할머니 매미는 옷을 벗고 어디로 갔을까요? 매미 우는 소리가 통 안 들려요.” “옷을 벗고 어디서 목욕하는 중인가 보다. 물소리에 우리가 매미 우는 소리를 못 듣는 거고…” 한 달 전 제주 붉은오름 산보길에서 작은손주와 나누던 얘기다. 그 길고 더운 여름날 뜨겁게 타오르던 오렌지 빛 대낮에, 바람소리 하나 없는 백색의 적막 속에, 누군가의 존재가 내 생존을 깨우쳐 줄 동기가 필요해서 산골도 도회지도 나무가 있는 그늘에서는 저리도 매미가 울어쌓는가보다.
지난 백중부터 성큼 다가온 가을의 느낌. 껍질을 벗고 사라졌던 매미가 요즘은 아홉시가 넘은 늦은 저녁까지 목청을 가다듬어 노래를 한다. 머지않아 처서가 오고 그들은 온 곳의 흔적도, 갈 곳의 흔적까지도 지워버리고 갑자기 사라진다.
시간을 낼 수 있는 가까운 친구들이 휴천재와 지근에 있는 문정공소에서 작은아들 성하윤(빵고) 신부와 임마르코 신부님의 집전으로 미사를 올렸다, 지난 10년간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봐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미사를 드렸다.



오늘 미사 복음이 골라도 그렇게 고를 수 없는 살벌한 내용이다.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지 말라. 분열을 주러 왔다.” 당신을 믿으면 집안식구 전부가 갈가리 찢어져 머리 터지게 싸울 일만 남았다는 말씀 같은데, 어떤 집안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못돼 먹었을까?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집안들은 '내 배 부르고 등 따수면 타인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빵고신부 강론에 수긍이 간다.
‘내 새끼’까지는 봐 주는데… 부모도 모르는, 극단적으로 자기만 아는 사람들. 내게 아주 가까운 어느 친지. 돈과 명예 건강을 모두 가졌지만 자식이라는 1촌 이외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내 새끼’는 존재하나 제 부모마저 짐이 될 즈음에는 폐기처분하고 나 몰라라 했다.
그러니 이웃, 더구나 이 사회의 운명이 눈에 보일 리 없다. 정치문제만 나오고 지지하는 당이 다르면 자식과 친구와도 말도 나누지 않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모든 언행이 극우여서 그가 입을 열면 주변사람들 마음이 일시에 쨍~ 하고 얼어버린다. 며칠 전 보스코가 평화방송에서 언급한, 단테가 보니 지옥에서 얼음에 갇혀 있더라고 한, 루치퍼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 사랑이 얼어버린, 지옥 밑바닥 같은 마음들…
예수님은 ‘사람이 평화로우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극단적인 사례를 드셨다고’, ‘제발 이타적으로 남 좀 돌아보라고’, ‘사람답게 살면 그 열매로 평화는 절로 따라온다는 말씀이라고’ 강론을 조리 있게 풀어가는 아들. 친구 한목사는 빵고신부의 강론보다 아들 강론에 연신 머리를 조아리는 엄마가 더 은혜스럽더라며 나를 놀렸다.

미사 후에는 곧장 함양읍내에 있는 ‘샤브향’으로 갔다. 그동안 나와 가깝던 분들과의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문정공소 교우들과 마천 음정교우들, 남해와 산청과 함양의 친지들, 서울에서 내려온 분들, ‘느티나무’ 친구들, 내가 몸담아 사회활동을 하던 친구들, 오빠 부부와 시동생 부부, 친구 한목사와 네 딸! 얼마나 차고 넘치게 사랑을 받아왔는가! 이렇게 받은 사랑은 나뉘어야 평화가 온다는 말이겠다.



손님들이 가고 이 행사를 마련한 딸들이 ‘콩꼬물’에서 환담을 나누다, 그것으로 모자라 휴천재로 모여와 소담정에서 차를 나누다, 다시 휴천재로 올라와 다과를 들다 느즈막하게 서울로들 떠났다. 그미들이 가고나니 주일 저녁 성당문을 닫을 때의 신부님들의 싸~한 마음이 알 듯하다.
오늘로 3650꼭지를 쓴 ‘지리산 휴천재 일기’는 매미의 껍질처럼 벗어서 내려놓고 싶다. 어느 나무에 기어올라 어떤 초가을 노래를 또 부를지 아직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흰 눈 속에 묻혀 모든 것이 자취 없는 계절의 이치를 안다.
밤늦게까지 일기를 쓰는 대신에 여유가 생긴 시간이면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이 생각하고, 제일 기분 좋은 건 잠자리에서 보스코와 함께 시를 읽으며, 우이동 시인들과 특히 타골의 시를 읽으며 잠들 여유가 생긴 거다. 당분간은 그런 여유를 누리려 한다.
(그동안 어줍잖은 휴천재 일기를 연재해준 가톨릭프레스에도 감사하며, 타골의 다음 시[“기탄잘리 93”]로 ‘지리산휴천재일기’ 10년을 닫는다. 그간의 독자 모두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를 드린다.)


떠나겠나이다. 안녕히 계시오소서, 형제여!
내 형제들에게 절하며 작별하나이다.
여기 내 문의 열쇠를 돌려드리나이다.
또 내 집에 대한 온갖 권리도 포기하나이다.
오직 그대들로부터 마지막 다정한 말씀을 간청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웃이었나이다.
하지만 주기보다는 받은 것이 많았나이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