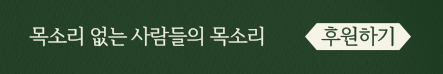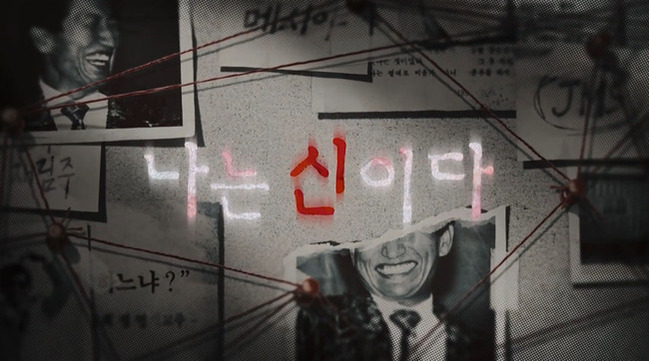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는 오늘로 1443차를 맞았다. 이번 수요시위는 지난 6일 눈을 감은 손영미 평화의 우리집 소장을 추모하며 시작됐다.
손영미 소장은 2004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온갖 일을 도맡았다. 할머니들을 더 잘 이해하고 모시기 위해 쉼터 앞에 있는 경기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석·박사과정을 모두 마치기도 했다.
할머니들의 동지이자 벗으로 그리고, 딸로 16년을 살아왔다.
고인은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싸고 말도 안 되는 언론 기사와 피해자 할머니, 위안부 운동을 향한 공격에 영혼마저 쓰러지는 것 같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길원옥 할머니와 사무실 동료들을 걱정했다. 정의연은 “손영미 소장이 남긴 사랑과 따뜻함, 할머니를 향한 지극한 정성을 이제 정의연과 시민사회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 문미정
▲ ⓒ 문미정정의연은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결코 수요시위를 중단할 수 없으며 고령이신 피해자 할머니들이 해결을 보지 못하고 떠나신다 해도 수요시위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뜻을 선언했다.
앞으로 우리 연대는 더욱 커지고 단단해질 것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이행 ▲과거사 반성과 역사왜곡을 중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악의적인 왜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악의적인 왜곡,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손영미 소장이 “검찰의 과잉수사, 언론의 무차별한 취재경쟁과 반인권적 취재 행태에 힘겨워하고 불안해했다”며, “소장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셔서 어쩌나요, 할머니 식사 잘하시고 계십니다’ 자신과 나눈 마지막 문자라면서, 피해자와 운동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소장님의 역할을 너무 당연시했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 ⓒ 문미정
▲ ⓒ 문미정이나영 이사장은 고인의 죽음 뒤에도 언론의 여전한 취재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살인행위에 반성은커녕, 카메라와 펜으로 다시 사자(死者)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다. 참담하고 비통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힘겨운 상황에서도 위로하고 함께해준 유가족들과 장례위원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또한 활동가들의 안녕을 위해, 어둠의 터널 끝에 건강하게 손잡고 서있길 간절히 기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게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는 간절함을 남겼다.
이날 수요시위를 주관한 한국여신학자협의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세상에 알리는데 공헌했으며, 1990년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창설부터 함께 해오고 있다.
이날 수요시위에 참석한 김혜원 정의연 고문·여신협 자문위원(정대협 창립멤버)은 “1992년 1월 8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최초로 수요시위를 감행한 날”이라면서, “우리가 용기를 다해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 첫 날”이라고 말했다.
 ▲ ⓒ 문미정
▲ ⓒ 문미정성경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성 주위를 돌았던 것처럼, 당시에 50여 명의 여성들이 일본대사관 주위를 돌았다. 그 당시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고 정부도 부정적인 눈초리로 보는 시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외로운 싸움이 지금은 사람들의 호응과 지지를 받고 세계 평화 운동가들의 후원 속에서 여성인권과 세계 평화를 주장하는 일을 해나가는 운동의 중심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불순한 반대 세력들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며,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운동이기에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일본이 할머니들 앞에서, 전쟁범죄를 사죄하는 그 날까지 씩씩하게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손영미 소장의 편안한 영면을 바라며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 단체들의 연대 성명도 이어졌다.
이날 수요시위에는 윤순녀 정대협 전 공동대표를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문재 해결 운동을 이끌었던 이들이 함께 했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