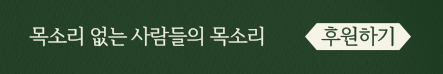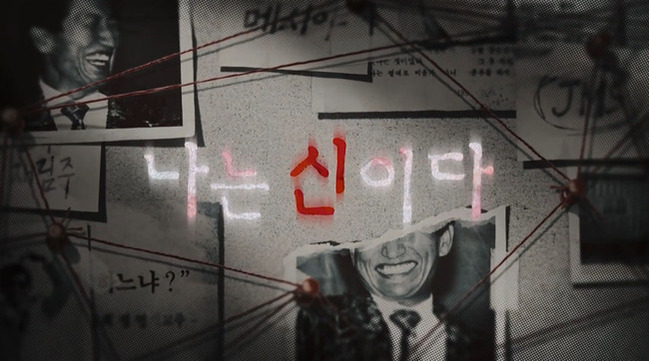▲ (사진출처 = vatican news/ANSA)
▲ (사진출처 = vatican news/ANSA)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현지시간으로 24일, 세계 소통의 날(World Communications Day) 메세지를 발표했다. 오는 6월 2일 기념하게 되는 제53차를 세계 소통의 날을 앞두고 교황은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에페 4,25)는 주제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교황은, 인터넷 문화가 사람 사이의 구별과 분류보다 인류 공동체의 결속과 일치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훌륭한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거짓 정보를 비롯해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교황은 인터넷 문화가 가진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지적하며 특히,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의 부정적 기능을 극복하려면 오늘날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인터넷의 어원인 ‘그물’(net)에 대해 묵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의 어원인 ‘그물’은 중심, 위계제도, 수직적 조직 형태 없이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선들과 그 교차점을 뜻한다.
‘그물’은 ‘공동체’를 은유한다고 설명하며 사회관계망과 같은 가상 공동체가 “신뢰감으로 돌아가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때” 더욱 강해지며 이를 위해 “책임감 있는 언어 사용을 기반으로 한 상호 경청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사회관계망 공동체가 곧바로 공동체와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며 “보통의 경우 이러한 가상 공동체들은 공통 관심사와 같은 약한 유대를 통해 서로를 인지하는 개인들의 집단으로 머물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사회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인종, 성, 종교 등의) 별의 별 편견을 내뿜으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보다는 구분 지어 스스로를 정의한다”면서 “이러한 경향은 다양성을 배척하는 집단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들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휘몰아치는 소용돌이를 양산하고마는 고삐 풀린 개인주의까지 조장한다”고 경고했다.
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문화는 ‘세계를 향해 열린 창’이 아니라 ‘개인의 나르시시즘을 뽐내는 쇼윈도’를 만든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연결된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면서 젊은이들이 사회 관계망만으로도 관계적인 차원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환상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유리시키는 사회적 은둔자(social hermits)”가 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관계는 늘어나지만 오히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인터넷 문화의 대안을 서로의 지체라는 비유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팔과 다리 등의 기관이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유기체로서 하나의 신체를 이루는 것과 같이 “서로의 지체”라는 비유는 “일치와 ‘다름’에 기반을 둔 우리 정체성”을 생각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가진 한 지체의 기관으로 인지한다”고 말하며 “이는 다른 사람들을 잠재적 경쟁자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적조차도 사람으로서 여기는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웃을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개인(individual)에서 이웃을 여정의 동반자로 여기는 사람(person)이 됨으로서 더 인간답게 변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같이 강조하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만 진정으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은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몸과 마음, 눈과 눈빛, 숨결을 통해 살아 숨 쉬는 육신을 통한 만남을 보완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한 가족이 서로 더 연결되기 위해,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기 위해 인터넷을 쓴다면, 교회 공동체가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조직하고 함께 성체성사를 드릴 때, 물리적으로 우리와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선을 추구할 때 인터넷은 하나의 자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사람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기 위한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회 역시 성체성사를 통한 일치로 짜여진 관계망”이라며 “교회 안에서의 일치는 ‘좋아요’ 버튼이 아닌 그리스도의 지체에 의지하며 이웃을 환영하는 표시인 ‘아멘’에 의존한다”고 비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