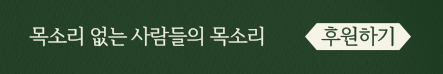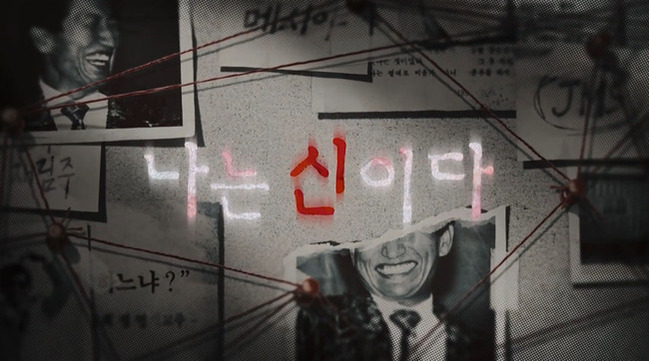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일 ‘성서에서의 질병과 고통’이라는 주제로 열린 교황청 성서위원회 연례 정기총회 참석자들을 만나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허리를 숙여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성서에서의 질병과 고통’이라는 주제에 관해 “신자와 신자가 아닌 이들 모두와 연관되는 주제”라며 “실제로 인간 본성은 죄로 인해 상처를 입으면서 본성 가운데 한계, 노쇠, 죽음을 새기고 다니는 존재”라고 지적했다.
최근 급작스러운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주제는 특히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우려와도 일치한다”며 “그 우려란 현대적 사고방식에서 질병과 유한성은 주로 상실, 무가치 또는 무슨 수를 써서든 무력화시켜야만 하는 해로움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질병과 유한성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것은 질병과 유한성이 갖는 도덕적, 존재적 함의가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들 누구도 그러한 ‘이유’를 탐구하는 일을 피할 수는 없다.
교황은 “종교인조차도 고통의 경험과 마주하면 흔들릴 때가 있기 마련”이라며 “고통이란 두려운 현실이며, 고통이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를 덮칠 때, 신앙이 뒤흔들릴 정도로 얼떨떨해질 수 있다. 이때 인간은 교차로와 마주하게 된다. 인간은 고통으로 인해 자기 안으로만 파고들어 절망과 반항에 이를 수도 있고, 고통을 성장의 기회이자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를 식별하는 기회로 받아들여 하느님과의 만남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서는 질병과 죽음이라는 문제에 관한 통상적이고 이상적인 해답이나 운명론적인 해답을 내놓지 않는다. 이러한 해답은 질병과 죽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정의를 탓하며, 심하게는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고개를 숙이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운명을 탓하며 모든 것을 정당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서적 인간은 고통이라는 보편적 조건을 하느님이 옆에 계심과 하느님의 공감을 만나는 공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느님은 선한 아버지이시며, 무한한 자비로 자신의 상처 입은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키시어, 이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교황은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조차 사랑으로 변화하며, 이 세상 모든 것의 종말이 부활과 구원의 희망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하느님은 병자를 바로 그러한 유약함의 경험을 통해 온전한 선에 참여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에 더해 “우리가 고통을 체험하는 방식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는 물론, 자신의 한계를 성장과 구원의 기회로 받아들이려는 의지에 관해 무언가를 말해준다”며 “이것이 바로 요한 바오로 2세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기반하여 고통의 길이 인간을 더 큰 사랑에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의 길이라고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질병은 하느님의 방식인 친교, 공감, 온유에 맞는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연대를 경험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허리를 숙여 다가가는 것이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온전한 실현과 진정으로 공동선을 지향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 TAG